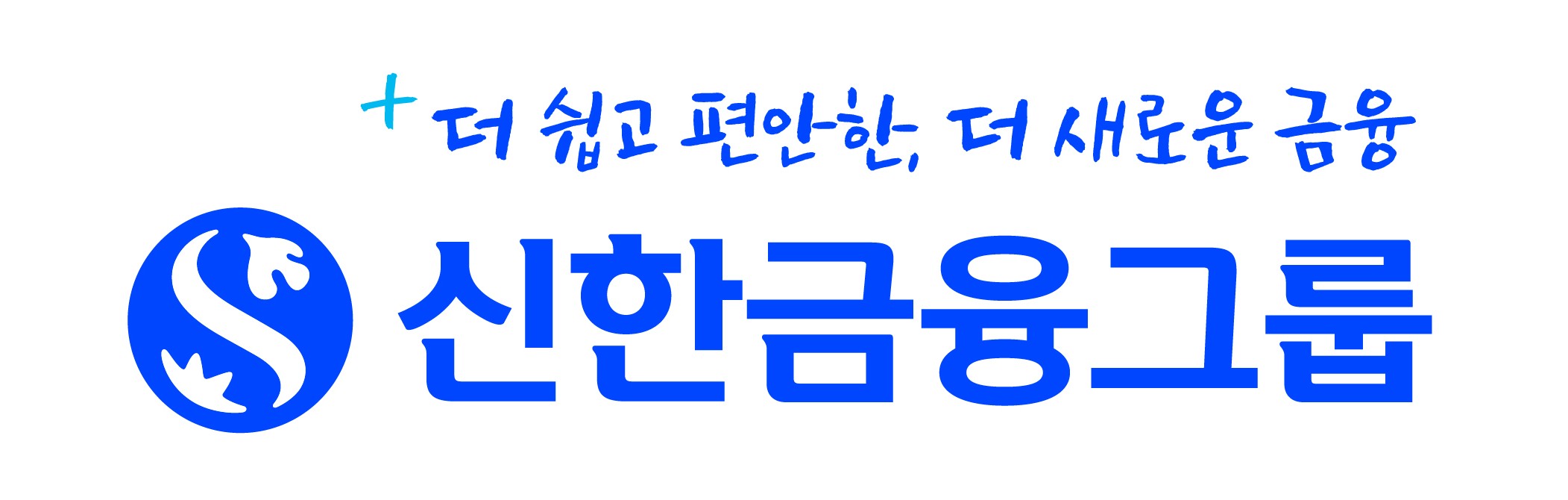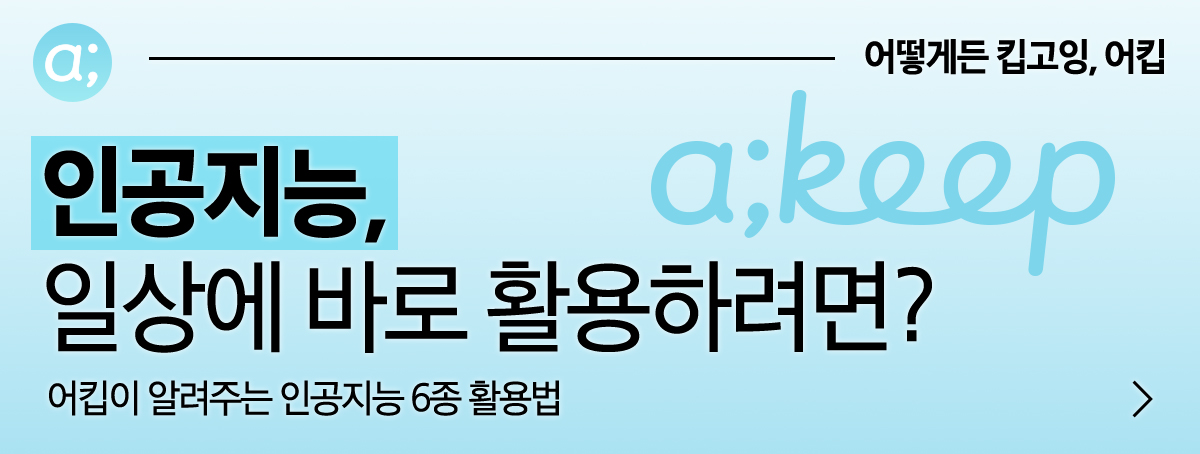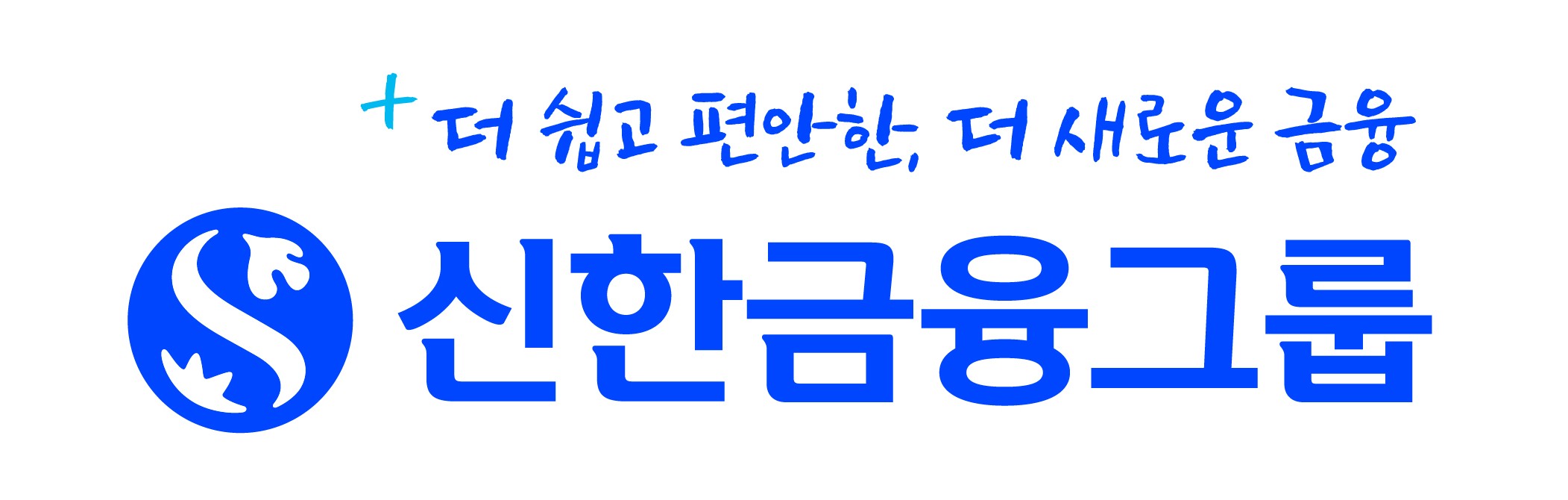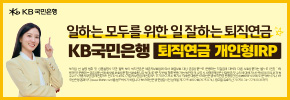![비대면 강의.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1146/art_1762991991652_a7a1eb.jpg)
【 청년일보 】 13일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가장 최신 자료인 지난해 2학기 기준으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 등 주요 6개 대학에서 총 534개 강의가 비대면으로 치러졌다.
연세대가 321개로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56개), 서울대(51개), 고려대·한양대(각 44개), 서강대(18개) 순이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이후 본격적으로 대면 수업이 재개된 2022년 2학기와 비교하면 서울대(3→51), 연세대(34→321), 서강대(1→18) 등 3곳은 오히려 비대면 강의가 더 늘어난 상황이다.
교수 1명 당 수백 명의 학생을 맡는 데다 강의실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대학이 '재정 효율' 등을 이유로 비대면 수업을 늘리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아울러 '대학의 공장화'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비대면 강의를 맡은 교수들의 느슨한 학사 관리와 취업난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학점 과열 경쟁이 중첩되며 'AI 커닝' 사태를 낳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한 사립대의 A 교수는 "동영상 강의는 코로나19 시기엔 고민의 결과였지만 지금은 비용 절감 차원"이라고 털어놨다.
교수 입장에서도 비대면 강의가 편리한 점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학생과 마주할 필요 없이 동영상만 촬영하면 되고 재활용도 가능하다. 일부 수업은 시험마저 비대면으로 보며 관리·감독 업무는 더 적어졌다.
'AI 커닝' 파문을 쏘아 올린 연세대의 '자연어 처리(NLP)와 챗GPT' 수업도 600명이 비대면 중간고사를 봤다.
학점 경쟁과 취업 준비에 시달리는 학생 역시 비대면 강의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영상 시청으로 출석을 대신하는 데다, 과제와 시험의 감시망이 아무래도 느슨해서다.
서울대 4학년 김모(25)씨는 "비대면 시험의 경우 커닝의 유혹이 솔직히 없을 수 없다"며 "챗GPT까지 나왔는데, 학생 입장에선 안 하면 오히려 손해 보는 느낌"이라고 했다.
비대면 강의가 늘어날수록 자연스레 교육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수도권 국립대 교육학과의 C 교수는 "어떻게 학생 600명, 1천명을 강사 1∼2명에게 맡기는 게 가능하겠느냐"며 "대형 입시 학원 모델을 가져온, 교육의 공장화"라고 비판했다. C 교수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비용 절감일 뿐"이라며 "대학의 자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