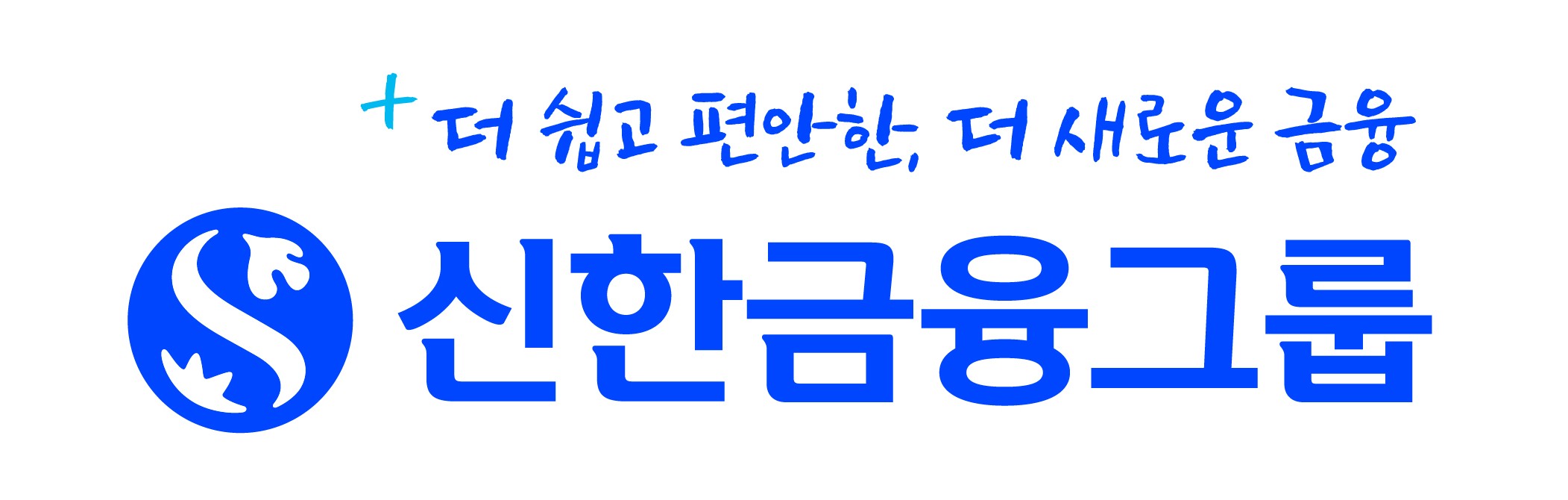![청년서포터즈 9기 김민근 [영산대학교 물리치료학과 4학년]](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1147/art_1763686897905_4eb297.jpg)
【 청년일보 】 2025년 청년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사회적 과제에 관한 현황과 전말을 살펴본다.
2024년 말 대한민국 1인 가구는 800만 가구를 넘어 전체 가구의 42%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만 19~39세 청년층의 64.5%가 1인 가구로 나타났으며, 31~33세 사이 청년들의 1인 가구 비율 증가가 두드러진다.
한편, LH토지주택연구원은 청년 1인 가구의 자가 점유율이 14.6%에 불과하며, 부동산 가격과 금리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가 결혼과 출산 기피 등 사회 전반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분석했다. 서울에서 청년 1인 가구 중 53%가 월세로 거주하며, 평균 주거 면적은 30.4m²에 불과하고 이들이 주거비로 소득의 23.4%를 지출하는 실태가 보고됐다.
서울시 미디어재단은 33m² 이하 원룸의 평균 월세가 약 68만원으로, 사회 초년생 월급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내야 하는 현실을 고발하였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청년 1인 가구가 가족이나 친구와의 교류가 적을수록 우울과 정서 불안 위험이 높아지며, 정신건강 지원이 절실함을 밝혔다. 특히 여성 1인 가구는 주거 지역 안전 문제에 대해 더욱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24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 상승률 탓에 실질적 부담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이다. 서울시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1만 5천 명에게 연간 최대 240만 원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LH토지주택연구원은 주거비 부담 완화, 공공임대 공급 확대, 금융 및 생활지원의 통합적 정책 추진을 권고하며 근본적인 청년 주거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 청년들은 높은 월세와 보증금 부담을 견디며 좁은 원룸이나 셰어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다. 셰어하우스의 경우 비용 부담 경감은 가능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공동생활 갈등은 변화하지 않은 고민거리로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2025년 1인 가구 정책의 핵심 과제로 경제적 지원 확대를 꼽는다. 지난해 청년 1인 가구 사이에서는 극단적 절약과 'N포' 현상이 심화됐으며, 노동시장 취약 청년들과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캥거루족'의 증가가 뚜렷하다. 이런 현상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필수임을 의미한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려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중심 밀착형 정책 시행이 요구된다.
이처럼 청년 1인 가구 증가는 단순히 '혼자 사는' 현상을 넘어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고립이 중첩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
【 청년서포터즈 9기 김민근 】